
연인·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60대 여성이 30대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제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0대 여성도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모두 이별 통보 때문이었다.
교제 폭력이 살인 단계에 이르는 데는 반복적인 폭력과 스토킹, 강압적 통제 등 전조 증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제 살인의 전조로 여겨지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규율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보고서를 통해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하다”며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비난하고, 명령과 지시를 따르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수사·사법기관이 이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압적 통제는 상대방의 이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주고 비난하기, 행동 자유 빼앗기,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사해 행위를 일컫는다. 보고서가 ‘통제 피해’에 주목하는 것은, 신체적 부상 정도를 통해 피해 결과를 측정할 수 없어 대체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론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2022년 가정폭력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당한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체적 폭력(80.4%), 성적 폭력(70.3%) 피해율보다 높다.
물론 형법상 통상적인 폭행 및 협박죄로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간 해결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교제폭력 등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인데,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는 처벌불원 허용은 사건 접수부터 걸림돌이 된다고 허 조사관은 지적했다.
지난달 거제에서 발생한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폭행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전 폭력 신고만 11건에 달했는데 모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친밀한 관계 폭력에서 가해자를 처벌불원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이기보다는 보복폭행의 두려움이 배경인 경우가 많다. 여가부가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우자/파트너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46.7%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도 처벌하거나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제 범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호주에서는 7~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 조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통제 행위에 시달렸고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음에도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망한 후에야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큰 공백이 있었다”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이뤄져야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밀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해자 처벌에 ‘반의사불벌죄’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허 조사관의 주장이다.
허 조사관은 “교제 및 배우자 관계에서의 폭력을 사적인 일로 경미하게 치부하며 중재와 화해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낡은 관행이 오늘날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며 “통제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된다면, 경찰의 수사 규칙 및 대응 매뉴얼을 통해 수사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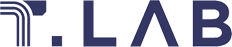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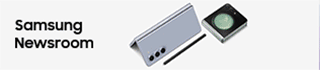






![[속보] 尹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10~11일 워싱턴 방문](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7/05/kuk202407050133.275x15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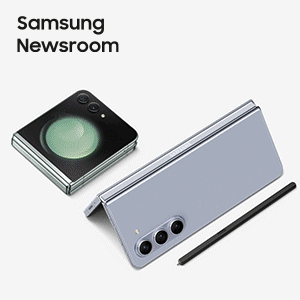
 포토
포토





![시대를 앞서간 천재 이세돌 [데스크칼럼]](http://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7/03/kuk202407030316.300x280.0.jpg)